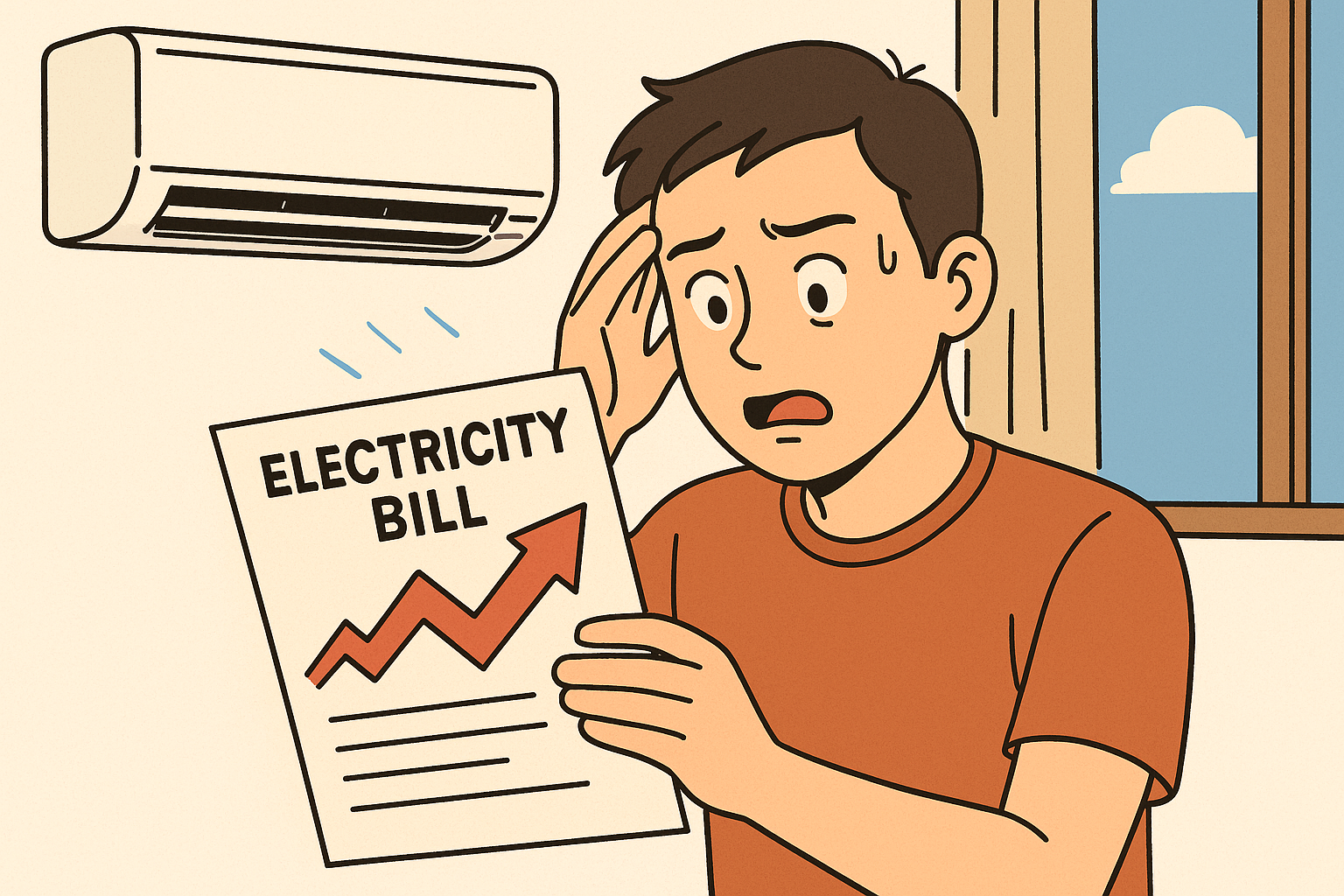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따뜻한 밥이 완성되는 즉석밥 ‘햇반’. 간편식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밥을 다 먹고 난 뒤 남는 하얀색 플라스틱 용기, 아무 생각 없이 재활용통에 버리는 사람이 많다. 과연 이 용기는 재활용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는다.
◆ 햇반 용기의 재질은 ‘PP’, 그런데 왜 재활용이 안될까
햇반 용기의 재질은 **폴리프로필렌(PP)**이다. 표면만 보면 일반 플라스틱 그릇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일 플라스틱이 아니다. 밥을 오래 보관하고 고온 멸균 처리를 견디기 위해 여러 겹의 필름이 접착된 다층 구조로 제작된다. 이 복합소재가 문제다.
재활용 공정에서는 단일재질의 플라스틱이 녹여져 다시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햇반처럼 여러 수지가 섞여 있거나 접착층이 포함된 구조는 녹는 온도가 달라 분리가 어렵다. 결국 선별장에서 대부분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된다.
즉, 겉면에 ‘PP’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비(非)재활용성 포장재다.
◆ 뚜껑과 용기, 라벨까지 모두 다르다
햇반 하나를 뜯어보면 용기, 뚜껑, 라벨 모두 다른 재질이다.
- 용기 본체: PP 재질이지만 다층 필름 구조로 재활용 불가
- 뚜껑 필름: 폴리에틸렌(PE)과 알루미늄이 복합된 재질로 재활용 불가
- 외부 라벨: 종이 또는 비닐 재질로, 경우에 따라 분리 가능
따라서 햇반을 다 먹은 뒤에는 용기와 뚜껑 모두 일반쓰레기, 라벨이 종이 재질이라면 따로 떼어내 종이류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맞다.
◆ “깨끗이 씻으면 재활용?”… 아니다
용기를 깨끗이 씻어내면 재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세척을 해도 내부의 접착층과 방습 코팅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겉보기엔 플라스틱이지만, 내부는 화학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복합소재 구조다. 재활용 공장에서 이 용기를 분리해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 ‘재활용 어려움’ 등급, 제조사도 알고 있다
환경부는 모든 포장재에 재활용 용이성을 등급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햇반 용기를 자세히 보면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가 있다. 이는 제조사인 CJ제일제당이 임의로 붙인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에 따라 표시한 것이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붙은 제품은 수거업체에서 대부분 일반 폐기물로 분류하거나, 수거하더라도 선별 과정에서 제외된다. 쉽게 말해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 기업들도 친환경 포장재 연구 중
즉석밥 포장재의 재활용 문제는 오래된 과제다. CJ제일제당은 햇반 용기를 단일재질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일부 해외 시장에서는 생분해성 소재를 적용한 시제품도 선보였다. 하지만 즉석밥은 멸균·보존·밀폐가 모두 요구되는 까다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 상용화된 포장재로는 완벽한 대체가 어렵다.
식품 안정성과 환경 규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친환경 포장기술이 개발되어야만, 햇반 용기가 진정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 올바른 분리배출법
햇반을 먹고 난 뒤에는 다음 절차로 버리는 것이 환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 남은 밥과 음식물을 완전히 비운다.
- 뚜껑 필름을 완전히 떼어낸다.
- 용기와 뚜껑을 모두 일반쓰레기로 배출한다.
- 종이 라벨이 붙어 있다면 라벨만 분리해 종이류로 버린다.
이 과정을 지키면 재활용 공정에 혼선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자원 회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결국 해답은 ‘덜 쓰는 것’
햇반 용기는 편리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환경 부담의 상징이기도 하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낮은 현실에서, 진정한 해결책은 ‘덜 쓰는 것’이다. 집밥을 지을 여유가 있다면 밥솥을 활용하고, 남은 밥은 다회용 용기에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지금의 햇반 용기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결국은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재활용의 출발점은 분리배출보다 소비습관의 변화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