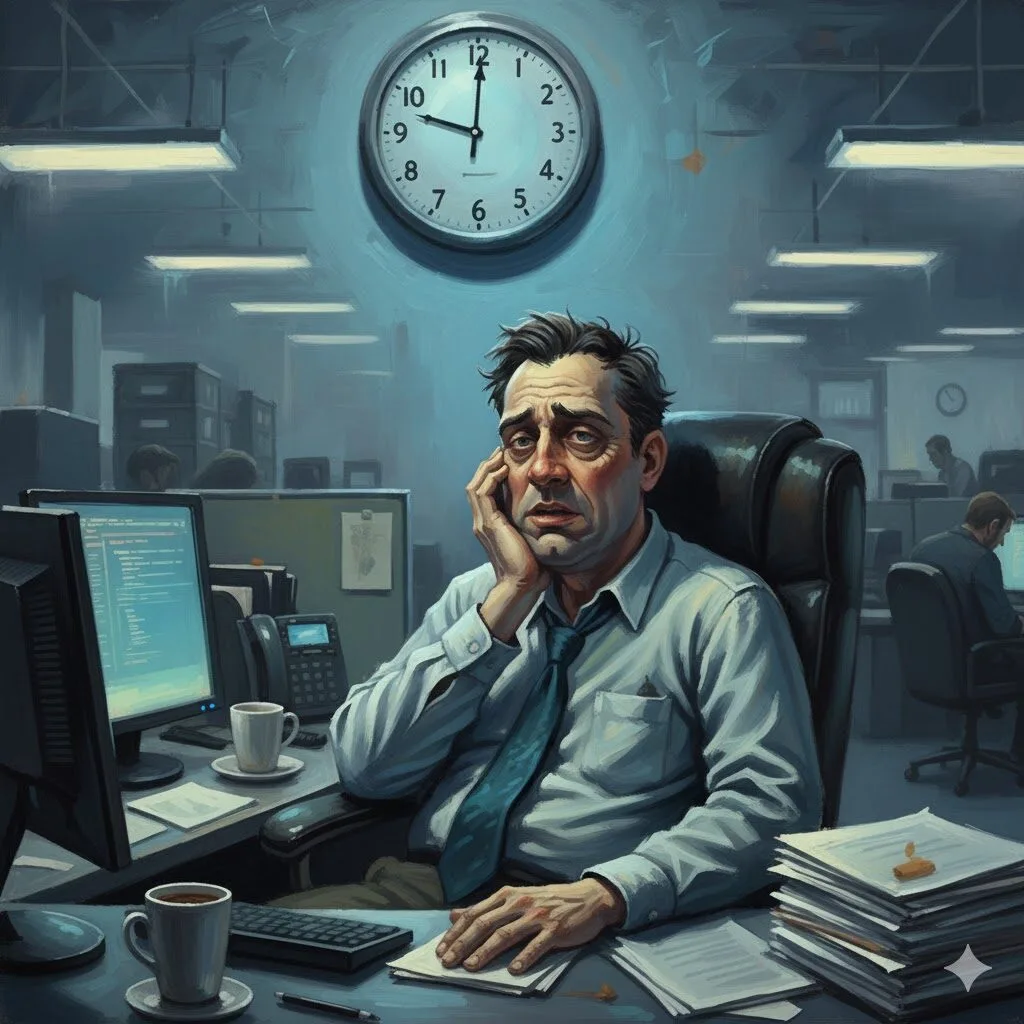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러다 과로사하는 거 아닐까”란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그 죽음이 과로 때문인지 판단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2023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과로사에 대한 구체적 판정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뇌심혈관계질환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는지, 또는 자연적인 병변인지 판가름하기 위해 정부는 정량적 근거와 정성적 요소를 병행해 따지고 있다.
■ 과로사, 단순히 “피로누적”으로는 부족
과로사는 단순한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망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업무 중 발생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등이 그 기준이 된다. 뇌출혈, 심근경색, 뇌경색, 협심증 등 급성 질환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갖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과로
정부는 과로를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급성과로는 발병 24시간 이내에 예측하기 어려운 급작스러운 업무변화가 있었는지를 본다. 단기과로는 발병 1주일 이내 업무량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만성과로는 3개월 이상 장기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을 경우다.
특히 만성과로는 근무시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긴 경우는 질병과의 인과성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4주 기준으로는 주 64시간 이상이 기준이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인과성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때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1.3배로 산정돼 기준을 초과하기 쉬운 구조다.
■ 단순 시간만 보지 않는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정부는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본다. 여기에는 교대근무, 휴일 부족, 해외출장, 유해한 작업환경, 정신적 긴장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나 반복적인 야근, 과도한 책임이 따르는 직책도 인과성을 높이는 요소다. 실제로 60시간 기준을 넘기지 않아도, 이들 가중요인이 중복되면 과로사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할까?
과로사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선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근무기록,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직무기술서, 인사기록, 동료의 진술서 등이 있다. 사망진단서나 부검 소견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과로사를 입증하기 위해 유족들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진정을 넣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재 인정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나는 괜찮겠지”라는 착각
정부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를 1차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월~토까지 하루 10시간씩 일하면 충족되는 시간이다. 하지만 IT, 물류, 의료업 등 특정 업종에선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야간근무, 출장, 초과근무가 반복되면 산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특히 기존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라면 산재가 인정된다. 과거에는 기저질환이 있으면 산재 인정이 어려웠지만, 최근 판례와 고시 개정으로 그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 실무자 조언: “과로의 흔적, 미리 기록하라”
노무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과로의 흔적을 남겨라”고. 평소 출퇴근 기록을 꼼꼼히 챙기고, 업무일지, 메신저 기록, 이메일 내역 등 업무 관련 자료를 꾸준히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는 산재 입증 시 핵심 자료로 작용한다. 특히 비정규직, 파견직, 프리랜서처럼 근무기록이 불투명한 경우엔 스스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일하는 방식은 안전한가? 현재 내가 일하는 환경이 과로사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죽음’ 이후에야 문제를 인식하는 구조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